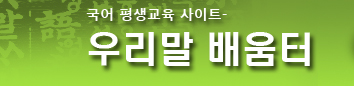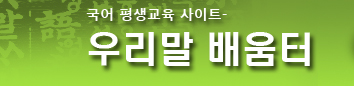“수박이 뭐냐”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호박과에 속하는 넝쿨
식물의 열매다.크기는 호박만 하고 초록 바탕에 검푸른 세로줄 무늬
가 있다”,또 어떤 사람은 “호박처럼 생겼는데 쪼개면 빨간 속살이
먹음직스럽다.95%가 수분이고 달기가 꿀맛 같아 여름 별미다”라고
답할 것이다.둘 다 틀린 답은 아니다.다만 이때 침을 꼴깍 삼키는 사
람이 있다면 그는 수박을 먹어 본 사람이다.
도(道)는 말로 전할 수 없다.언어로 규정하는 순간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에 묶여버리기 때문이다.“도가도,비상도.명가명,비상명(道
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으로 시작되는 노자(老子) 도덕경 1장
은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다.부처가 8만4천경을 설한 후 “나는 아
무 것도 설한 바 없다”고 말함으로써 후학들이 문자에 얽매이는 것
을 경계했듯이,노자는 그 첫장부터 말의 함정을 경고해 놓고 시작한
것이다.그렇다고 문자로 남아있는 도를 도가 아니라고 외면할 도리
또한 없다.노자 스스로 “말로 표현된 도가 도 그 자체는 아니다”라
고 해 놓고서 속절없이 문자로 남겼으니 말이다.
새 천년 벽두에 도 바람을 일으켰던 도올 김용옥(金容沃)의 도덕경
해설에 시비가 붙었다.김용옥을 지칭해 붙인 "노자를 웃긴 남자"라
는 책이 출판된 것이다.이경숙(40)이라는 낯선 이름의 이 노자 연구
자는 “내가 쓴 책이 바로 나의 경력일 뿐”이라며 자신의 인적사항
을 일절 밝히지 않았다.그러면서 그는 김용옥의 도덕경 주석을“틀린
정도가 아니라 삼류 개그 쇼”라고 몰아붙였다.첫 장부터 헛짚었다는
것이다.
도덕경이 문자로 전해진 이상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각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그러니 제각각 아는 만큼 보고 본대로 말할 수밖에
.누구의 주석이 옳고 그른지 범부가 알수도 없으려니와 또 한두 구절
이 틀린들 어떠랴.다만 모두가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이 황량한 시대
에 전국에 도 바람을 일으킨 것은 분명히 김용옥의 "법력"이라고
할 수 있다.더듬이 없는 곤충처럼 너도 나도 실용학문에만 눈이 어두
운 이때,한 코미디언(?)이 나타나 인문학 바람을 일으켰다면 그 또한
반가운 일 아닌가.그런 의미에서 김용옥의 주석에 이의를 제기한 것
또한 부질없다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한가지 분명한 것은 도를
말로 다 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어찌 도뿐이겠는가.일상의 진실
도 매한가지다.
2000/12/20 대한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