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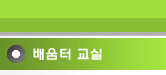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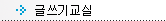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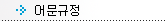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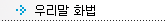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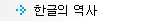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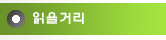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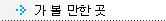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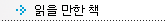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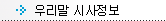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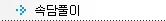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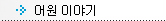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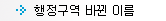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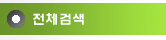 |
|
|
들른 이 180547849 명
깁고 더함 2007/12/2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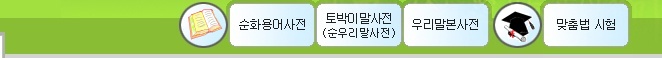 |
| |
|
| |
 |
| |
|
| |
|
 MC 정재환 '대한민국은 받아쓰기 중' 출간 MC 정재환 '대한민국은 받아쓰기 중' 출간
|
정재환(44)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3개가 있다. 방송, 공부, 우리말이다. 그는 SBS ‘도전 1000곡’ ‘백만불 미스터리’, EBS ‘코리아 코리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불혹의 나이에 대학에 진학해 현재 대학원에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글문화연대 부대표이기도 한 그는 최근 4번째 책 ‘대한민국은 받아쓰기 중’(김영사)을 내놓았다. 방송에 비치는 연예인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임을 알게 된 후 실망하게 될 때가 적지 않은데 정재환은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반듯하고 성실했다. 그는 또박또박 하고 바른 말씨로 신중하게 질문에 답했다.
―책에 볼썽사나운 영어 간판, 쓸데없는 한자 표기,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문구 등 뜨끔한 사진들이 많다. 책은 어떻게 출간하게 됐나.
“지난해 디스크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방송과 수업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누워만 있어야 했다. 그때 문자 환경의 현주소를 기록해 놓고 고발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필을 시작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전 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사진을 중심으로 우리 문자 환경을 보여주고, 이를 어떻게 편하고 아름답게 바꿔 나갈지 말하고 싶었다. 4∼5년 전부터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찍은 사진과 포털사이트에서 퍼온 사진들을 실었다. 옛날에는 사람을 구한다고 쓸 때도 가게에서 글씨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을 골라서 문구를 고민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글씨는 말할 것 없고 문구 자체가 파격적이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바른말 고운 말을 쓰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그러지 않는다.”
―우리 문자 환경은 특히 무엇이 문제인가.
“볼썽사나운 영어 간판, 한자 사용이 많다. 영어 표기가 필요하다고 해도 한글 옆으로 병기돼야 하고, 크기도 한글보다 작아야 한다. 일례로 상암월드컵경기장 표지판에 한글은 없다. 영어와 한자만 있을 뿐이다. 통영 사람이 서울에 와서 운전을 하지 중국인이 운전하겠는가. 친절 이전에 기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이름을 SK, KT, KB 등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글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우리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라디오 방송에서 팝을 소개할 때 발음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영어사전을 뒤졌다. 그런데 어느 날 영어가 아니라 국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국어사전을 갖고 다니며 맞는 표현인가 고민했다. 방송에서 하는 말은 사석에서 하는 대화와 달리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오해하게 된다. 지금은 전자사전을 들고 다닌다. 프랑스인들은 거실에 사전을 두고 들춰본다고 하는데, 한국인은 왜 국어사전을 안 보는지 모르겠다.
―현재의 진지한 모습에서 개그맨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개그맨으로 데뷔해 방송진행자로 돌아선 계기는 무엇인가.
“1983년 데뷔해 스탠딩 개그를 했다. 개그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무대라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했다. 방송진행을 제의 받고는 이를 계속 개발해 나가면 고유한 영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매번 방송을 돌이켜보며 ‘그때는 이 표현이 더 낫지 않았을까’ 고민하다 보니 일이 점점 어렵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방송을 진행하며 농담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되레 유머감각이 필요해지고 있다. 신뢰감과 친근감을 동시에 줄 수 있도록 진지함과 농담을 조화시키려고 한다.”
―방송이 언어 파괴의 주범이라는 말도 있다. 방송 활동을 하며 느끼는 문제점이 있나.
“자막이 틀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방송사도 신문처럼 교열부를 거친 후 화면에 내면 좋겠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컴퓨터의 맞춤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담당 PD나 작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오락 영역에서는 어휘의 창조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오락적 언어는 문학에 비유할 수 있다. 좋은 소설을 쓸지, 삼류 소설을 쓸지는 창작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연예인들이 건강한 언어관을 바탕으로 개그맨, 연기자다운 말을 구사해야 한다.”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이 아닌 사학을 전공한 이유는.
“워낙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가 국어, 역사, 대중문화라 두 전공을 놓고 고민했다. 수업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을 따로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역사를 바탕으로 언어를 공부할 수 있다. 한글운동사와 언어정책 등의 연구 결과는 국문학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역사 쪽에서 이 부분에 접근한다면 그동안 나왔던 것들과 다른 색깔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이도 있다.”
―나중에 학계로 진출하는 것 아닌가.
“방송과 관련된 전공을 택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 쪽이라 힘들 거다.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박사 과정을 마치면 1년 정도 일본에서 가서 자료를 구하고 논문을 준비할 생각도 있다. 두루두루 배우는 것이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말글이 왜 좋은지, 왜 발전·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밝히고 싶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저 해달라.
“책 제목을 ‘받아쓰기 중’이라고 정한 것은 새삼 우리말의 가치를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에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갖자는 뜻이었다. 영어를 비롯한 각국 언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학업이나 일에 필요하다면 영어, 일어를 배워야 한다. 하지만 근본은 우리말이다. 튼튼한 국어 실력이 외국어 실력의 바탕이 된다. 우리 것을 세계 무대에 내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는 것 아니겠는가. 다양함이 공존하는 것이 진정한 세계화다. 우리 것을 내놓는 데 한글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2005/04/07 세계일보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