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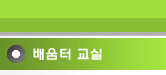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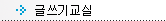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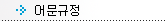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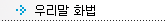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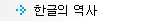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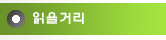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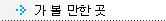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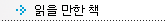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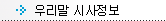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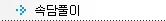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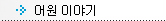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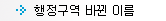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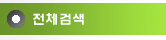 |
|
|
들른 이 180553461 명
깁고 더함 2007/12/2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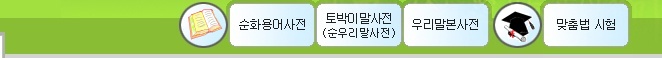 |
| |
|
| |
 |
| |
|
| |
|
 세계가 감탄한 기록문화의 우수성 세계가 감탄한 기록문화의 우수성
|
‘이곳에서 감탄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어디든지 책이 있다는 것이다.’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침공했던 프랑스 해군 장교 주베르는 이런 기록을 통해 당시 조선 사람들의 책 문화에 그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겼다.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훈민정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다. 〈승정원일기〉까지 합하면 기록물 4건이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장경판전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우리 민족이 창조한 기록유산들의 우수성은 정말 대단하다.
[한겨레원형질 민족문화상징 100] ⑪ 언어·기록
삼국시대부터 〈유기〉와 〈국사〉 같은 역사서를 남겼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시대부터는 역대 왕들의 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조선왕조실록〉은 바로 이러한 기록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실록에는 1대 태조부터 25대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 동안 역대 왕들의 기록이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고 방대한 기록으로 모두 남아 있다. 규장각에 보관된 정족산본 실록의 경우 1187책에 달하는데, 이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조선왕조실록〉은 철저한 기록과 함께 보관에 최선을 다해 기록물의 전부를 후대까지 남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자신들이 속한 시대에 따르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산속 사고(史庫)에 실록을 보관하였고, 정기적으로 실록을 철저히 점검하고, 점검한 장서 기록부인 ‘형지안’(形止案)까지 남기면서 후대까지 실록 보존에 최선을 다하였다.
역대 왕들의 행적이 중심이긴 하지만 실록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태종 때 일본에서 코끼리가 건너온 사실과, 정조가 안경을 낀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연산군 때 왕을 비판하다가 유배를 간 배우 공길과 중종 때 왕실의 의녀로 활약한 장금이의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어 최근 최고의 인기 문화상품이 되기도 했다. 실록 기록에서 우리 선조들이 살아갔던 모습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전통 기록들이 현대적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외에도 실록에는 조선의 최장수 왕 영조가 채식 위주의 식단을 주로 짰다든가, 조선시대 최고의 업적을 쌓았음에도 각종 질환에 시달렸던 세종이 육식을 즐겼다는 등의 흥미로운 기록도 숱하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철저하게 역사를 기록한 것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으로 공개되는 한 왕은 처신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조선 왕조가 상대적으로 부정과 비리가 적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요인으로 철저한 기록문화를 주저 없이 손꼽고 싶다.
〈직지심체요절〉과 〈팔만대장경〉, 〈훈민정음〉 역시 선조들의 뛰어난 기록문화를 대변해주는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직지심체요절〉은 금속활자로 만든 세계 최초의 책이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이 책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1454년 마인츠에서 42행짜리 성서를 금속활자로 간행한 것보다 80년 가까이 앞선 것이다. 뛰어났던 인쇄기술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깔끔한 금속활자로 인쇄된 실록, 의궤, 문집 등의 고전 도서들은 현재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대초원을 휩쓸면서 남하한 몽고족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보고자 간행한 불경이다. 총 매수가 8만1137장에 이르러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불린 이 목판에 고려인들은 한글자 한글자씩 온갖 정성을 다해 새겨 넣었다. 우수한 고려 문화의 전통을 확인하고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려 했던 그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현재 해인사에 보관된 팔만대장경 목판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동양에서 만들어진 20여 종의 ‘대장경’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1443년(세종 25년)에 이뤄진 훈민정음 창제는 오랜 숙원이었던 민족의 문자를 갖게 된 일대 쾌거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록물의 범위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어렵고 쓰기 힘든 한자 대신에 간편한 우리 글자 ‘한글’이 창제되면서, ‘어리석은’ 백성들도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바깥출입이 어려웠던 여성들 역시 한글의 수혜자였다. 궁중에서, 집안에서 일기, 수필, 편지를 한글로 써 내려간 여성들의 소중한 기록은 조선의 문화를 훨씬 풍요롭게 하였다.
최고 품질의 한지는 우수한 기록문화를 뒷받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에 이미 종이를 만들어 썼고 그 품질도 뛰어났다.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그 증거다. 조선 중기의 학자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중국보다 우수한 우리나라 물품 중의 하나로 경면지(鏡面紙), 즉 거울처럼 매끈한 조선의 종이를 꼽았다. 1866년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의궤 역시 초주지(草注紙)라는 뛰어난 한지로 만들었다. 품격 있는 의궤의 표지와 종이의 재질은 이방인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을 것이다.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기록유산들은 대한민국이 빠른 시일에 문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치열하고 꼼꼼했던 기록문화의 전통을 현대에도 계승하는 한편, 이들 기록유산들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현대에 적합한 문화콘텐츠로 확보해 나가는 방안들을 꾸준히 고민하고 찾아내야 할 책무가 바로 우리 후손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신병주/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
2006/10/12 한겨레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