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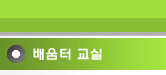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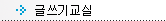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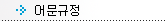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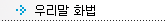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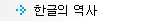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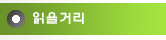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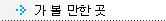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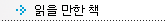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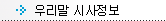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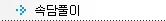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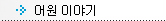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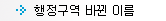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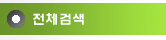 |
|
|
들른 이 180546385 명
깁고 더함 2007/12/2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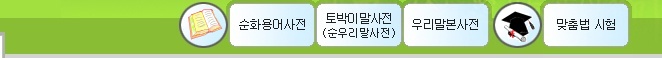 |
| |
|
| |
 |
| |
|
| |
|
 경상도 우리탯말 경상도 우리탯말
|
“작은 아배 건너 오시니껴? 마이 춥제요?” “아배는 좀 어떠노? 차도가 안 비재?” “어제보다 더 가라앉는 거 보이 힘들게시더.” “어예 맹줄이 이리도 깅고? 서로가 고새이따.”
숙부와 조카가 나누는 대화다. “왜 이리 명줄이 길까? 서로가 고생이다.”는 것을 보니 임종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말투로 봐선 안동 어느 고택이다. 추운 겨울날. 죽음의 문전에서 마지막 신고(辛苦)를 겪고 있는 아버지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를 지켜보는 이가 마치 스틸사진처럼 떠오른다.
이 말을 전부 표준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처럼 짙은 안동의 체취를 느낄 수 있을까?
‘말은 생각을 걸어두는 옷걸이’다.
그 ‘옷걸이’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전라도, 제주도, 함경도, 강원도…. 그 지역의 말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상이 녹아 있다.
위의 대화에서 ‘아배’를 보자. 서울 방언에 ‘아비’와 ‘에비’가 있다. 두 말은 아버지의 낮춤말이다. 부모가 애 낳은 자식을 부를 때나, 며느리가 어른 앞에서 남편을 말할 때도 쓴다. 그러나 경상도에서 쓰는 ‘아배’는 낮춤말이 아니다. ‘어매’도 서울 방언의 ‘어미’처럼 비칭이 아니라 어머니란 뜻의 평칭이다.
표준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거칠 수도 있겠지만, 대화 속에서 경상도 특유의 넉넉함과 격이 느껴지는 것은 안동 고유의 사투리라는 ‘옷걸이’ 때문이다.
사투리의 재인식을 주장해온 ‘탯말두레’가 ‘경상도 우리탯말’을 출간했다.
‘탯말’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 들어온 말로, 태어나자마자 배운 말이란 뜻이다. 시간이 지나면 섞이고 희석되는 핏줄과 달리 태생적으로 각인되는 ‘제대혈’같은 것이다. 변방의 비하적인 느낌이 드는 사투리보다 ‘탯말’에는 ‘지역언어’라는 주체적인 뜻이 담겨있다.
‘탯말두레’는 이 탯말을 되살리기 위한 인터넷 연구모임이다.
이 책은 두 편의 예화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임종한 노인을 두고 가족들이 장례와 제사를 지내는 절차를 그렸으며, 또 하나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진주여고에 부임한 대구출신의 선생님이 학생들과 벌이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대구에선 헤어질 때 가재이~ 칸다, 가재이~.” “쳉! 가재이가 먼데예?” “잘 가재이, 즉 잘 가란 얘기지.” “옴마야! 진주 여자가 오이가 오때서예?”
대구 아가씨들의 살가움을 얘기하는 총각선생님에게 진주 여고생들이 “진주 여자가 어디가 어떤데요?”라며 샐쭉거린다. 예화는 총 31편의 사투리 대화로 이뤄졌고, 이를 풀어 설명하는 글이 뒤따른다. 말의 유래와 변천, 말과 문화의 상관관계를 현장감 넘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예화 1편은 초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 책은 탯말에 국한되기보다 경상도 사람의 문화와 민속, 역사까지 아우르고 있다.전라도에는 마을마다 쉬는 공간 정자가 있지만 경상도에는 서원이 있다. 서원은 항상 언행을 삼가고,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한다.
당장 ‘때꺼리’가 없어도 문중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고,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도’라는 말로 기개를 떨치던(?) 경상도 사람의 성향도 이와 관련 있다. ‘보리문디’의 ‘문디’도 한센병 환자가 아니라 글 읽는 ‘초짜’선비 ‘문동(文童)’을 뜻한다.
경상도에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아랑의 전설은 있어도, 목숨 건 춘향의 연애담은 없다.이런 강함들이 거친 ‘탯말’에도 투영된다. ‘깔찌 뜯다’ ‘쭈굴시러버라’ ‘아까맹키로 다시 해바라’ ‘수닯다꼬 캐뿟는 기라’ 등 격음과 경음이 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은이들은 모두 국어학자가 아니라 사투리에 관심 있는 현지 사람들이다. 예화 1편을 집필한 윤명희 씨는 대구 출생으로 안동의 장손 집안에 시집 가 시아버지의 3년 상을 치르는 중이고, 진주 출신의 심인자 씨는 시골장터를 돌아다니며 채록한 사투리를 주제별로 정리해 ‘탯말독해’를 썼다.
탯말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어가자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지만, 경상도 독자에겐 구수한 일상의 언어를 글로 접하는 것만으로도 희한하고, 재미있는 일이다.
304쪽. 1만 원.
2006/10/28 매일신문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