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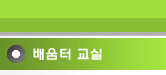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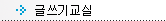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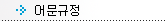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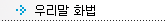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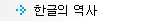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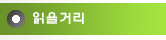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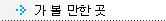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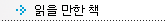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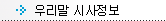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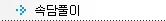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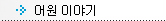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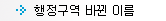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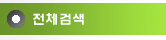 |
|
|
들른 이 179883311 명
깁고 더함 2007/12/2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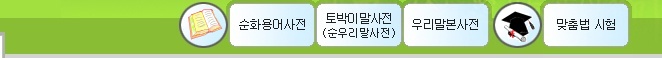 |
| |
|
| |
 |
| |
|
| |
|
 빌리다’는 ‘빌려주다’, ‘빌려오다’로 구분 빌리다’는 ‘빌려주다’, ‘빌려오다’로 구분
|
우리말에 하나의 어휘가 두 가지의 상반된 행위를 함께 지칭하는 것이 있다. ‘빌리다’가 그것이다.
사전에서 ‘빌리다’를 찾아보면 ①(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남의 물건이나 돈 따위를 얻어다가 쓰다. 빌려오다. ②(나중에 도로 받기로 하고) 남에게 물건이나 돈 따위를 내주어 쓰게 하다. 빌려주다. ③남의 도움을 받다. ④어떤 형식이나 사실을 끌어다가 쓰다. ⑤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기회를 얻다 등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나온다.
①빌린 책을 잃어버렸다. ②빌린 책을 도로 받았다. ③친구의 힘을 빌렸다. ④일기형식을 빌린 자전적 소설 ⑤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처럼 활용된다.
‘빌리다’가 빌려주다(貸)와 빌려오다(借)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행위를 아우르는 뜻을 갖게 된 것은 1988년 1월19일 문교부 고시로 표준어 규정이 공포된 이후부터다.
표준어규정 제6항에 ‘다음 단어들은 구별함이 없이 한가지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돐→돌, 두째·세째·네째→둘째·셋째·넷째, 빌다→빌리다’의 경우 뒤의 것으로 통일시켰기 때문이다. 표준어규정해설 제6항에 “빌다에는 ‘걸(乞)’, ‘축(祝)’의 뜻이 있기에 차(借)의 뜻으로는 ‘빌려오다’로, 대(貸)의 뜻으로는 ‘빌려주다’로 하여 ‘빌리다’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표준어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빌다’는 차(借)로, ‘빌리다’는 대(貸)로 했던 것을 바꾼 것이다. ‘갑돌이에게 100만원을 빌어왔다’고 하면 거저 비럭질해왔는지, 아니면 나중에 갚기로 하고 꾸어온 것인지 알 수 없었던 탓이다.
‘빌리다’가 대(貸)와 차(借)의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100만원을 빌렸다’고 하면 이것만으로는 ‘빌렸다’가 ‘빌려줬다’, ‘빌려왔다’라는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차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앞뒤를 살펴 헤아리는 수고를 따로 하게 된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돈셈이 복잡해서일까. 대차관계를 나타내는 ‘꾸다’와 ‘꾸이다’도 곧잘 헷갈린다.
‘꾸다‘는 ‘도로 갚기로 하고 남의 것을 얼마 동안 빌려 쓰다’란 의미이고, ‘꾸이다’는 ‘꾸다’의 피동형이며 준말이 ‘뀌다’이다. 즉 ‘꾸다’는 차(借)요, ‘꾸이다’는 대(貸)인 것이다.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100만원을 꾸어주었다’는 글에서 갑돌이 돈 100만원이 갑순이에게 간 것으로 알면 잘못이다. 이 경우는 ‘갑돌이가 (돈이 없어서 을순이에게 빌려다가) 갑순이에게 꾸어주었다’는 뜻이다. 갑돌이 돈이라면 ‘갑순이에게 뀌어주었다’로 해야 한다.
‘빌리다’는 대차의 뜻을 아우르고 있으니 되도록 ‘빌려주다·꾸이다(뀌다), 빌려오다·꾸다’로 명확하게 구획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3/12/04 파이낸셜뉴스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