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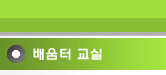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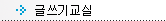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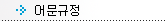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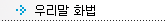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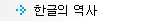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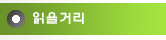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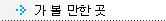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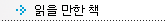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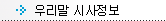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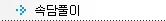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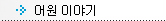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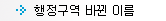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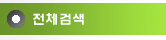 |
|
|
들른 이 180519141 명
깁고 더함 2007/12/2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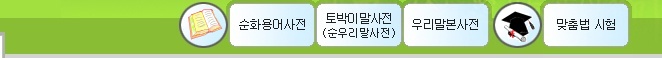 |
| |
|
| |
 |
| |
|
| |
|
 `조선통신사`→ `통신사`라고 해야 `조선통신사`→ `통신사`라고 해야
|
몇 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가 중국으로 수출되면서 중국에선 한국 대중문화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대중음악 가수들이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국내 연예 관련 사업은 계속 중국으로 진출을 꽤 했고,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멀리는 아시아 국가들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이뿐만 아니라 진출할 때마다 상상 이상의 인기와 수입을 올리고, 급기야는 미국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류 열풍 이전에 오래 전에도 '한류 열풍'은 있었다.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가 그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 후기에는 에도막부의 요청에 의해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통신이란 신의를 교환한다는 뜻으로 통신사는 조선국왕이 일본에 파견하였던 공식적 외교사절이었다.
통신사가 한양을 출발하여 에도에 도착하기까지는 6~9개월 가까이 걸렸다. 통신사 일행의 여정은 화려했지만 대단히 힘든 여행이었다.
통신사 여정은 한양에서 에도(서울에서 도쿄)까지는 대략 2,000킬로미터였다. 통신사는 궁궐에서 국왕에게 인사를 한 후 부산까지 내려갔다. 부산에 도착한 통신사 일행은 일본으로 가져갈 짐과 수행원, 배 등 모든 것을 점검하고 날을 택해 출발 날짜를 잡는다. 이 때 부산에는 안내를 맡은 쓰시마 번의 배가 마중 나왔다.
부산에서 출항하면 쓰시마에는 밤이 되기 전에 도착해야만 한다. 여기에 머물면서 통신사 일정에 관한 협의를 하고 배를 손보기도 한다. 쓰시마에서 오사카까지는 대선단으로 정해진 정박지 번의 접대를 받으며 항해를 계속한다. 주요한 정박지가 정해져 있지만 기상 악화로 이름 없는 작은 항구에 정박하기도 한다.
오사카부터는 요도가와라는 강을 거슬러 교토까지 간다. 요도가와의 강바닥은 낮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밧줄로 배를 묶어 끌면서 강을 천천히 거슬러 올라간다. 교토 도착 후부터는 육로를 이용하여 나아간다. 통신사가 지나가는 길가에는 구경꾼이 넘쳐났다고 한다. 통신사 행렬은 화려하고 아름다워 사람들의 즐거운 구경거리였다. 일본에서는 통신사 일행의 많은 짐을 운반하기 위해 총인원 30여 만 명의 일꾼과 총8만 마리의 말이 동원되었다.
이들의 왕래 일정은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개 6개월~1년이 소요되었다. 그 규모는 조선국왕의 국서를 가진 3인(정사, 부사, 종사관)을 포함하여 조선의 최고 관료, 학자, 예술인, 악대, 무인(경호원), 통역관 등 300~500인에 이르렀으며, 일본 막부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통신사를 접대하였다.
1607년 2월 29일(선조 40년. 음력)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관복을 차려입은 504명이 일본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꼭 400년이 흘렀다. 언론사와 한일 문화 교류 담당자들은 이런 역사적 의미를 가진 ‘통신사 400주년’을 맞아 그 발자취를 되짚어 가며 한ㆍ일 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신사의 출발지였음을 알리는 서울 남대문 앞의 기념 표석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조선통신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사절단이니, ‘조선통신사’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것은 어색한 표현이다. 일본에서 볼 때는 분명 조선에서 왔으니 ‘조선통신사’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통신사’라고 해야 옳은 것이 아닐까.
이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FTA 협상단’을 파견하면서, 말끝마다 ‘대한민국 FTA 협상단’이라 하는 격이다. ‘대한민국’을 붙여도 되겠지만, 역시 붙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물론 우리 협상단이 일본에 가면 일본은 우리 협상단에 대해서 반드시 ‘대한민국 FTA 협상단’이라고 할 것이 뻔하다. 이해가 안 되면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자. ‘노무현 대통령’을 일본에서는 ‘노무현 한국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야기다.
‘통신사’와 비슷한 것이 조선시대에는 여럿 있었다. 조선 후기 북경을 다녀오는 사절단을 일컬어 ‘연행사’라 했다. 중국 황제·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했던 사신을 ‘성절사’라고 했고, 이와 함께 정례적으로 ‘정조사(正朝使), 동지사(冬至使)’를 보냈다. 흔히 이를 함께 일러 삼절사(三節使)라고 한다. 그 밖에 조선시대 중국에 보냈던 사신으로 ‘문안사(問安使)’가 있었고, 청나라에 예물을 바치기 위해 보냈던 ‘세폐사(歲弊使)’가 있었다.
이들은 중국에서 일컬었을 때는 ‘조선 정조사, 조선 동지사, 조선 성절사……’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정조사, 동지사, 성절사……’라고 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주권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우리 국가를 일개 왕조로 전락시키며, ‘이씨왕조’라고 불렀다. 우리는 일본이 물러간 다음에도 이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부끄러운 때가 있었다. 우리는 일제의 강점기를 벗어나고도 한참 동안 ‘한일합방/을사조약’ 등 일제가 쓰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었다. 이제는 ‘국권강탈/을사늑약’이라고 의미를 재해석해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위안부’라는 단어도 ‘성노예’라고 쓰자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즉 ‘위안부’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진실을 호도하려고 만들어낸 표현이다. 제국주의 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가 평생을 망친 피해자들에게 ‘위안’하러 갔다는 것은 가슴에 또 한 번 피멍이 들게 한다.
보도에 의하면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
(http://www.joseontongsinsa.org)가 발족하고, 조선통신사가 문화 코드로 등장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시에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고 당시에 먹었던 음식, 입었던 옷까지 복원하며 진보하고 있다. 이 기회에 ‘조선통신사’라는 명칭도 어떻게 쓸 것인지 역사적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
2007/04/24 국정브리핑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