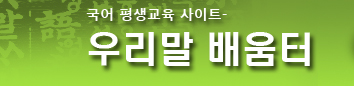 |
|
|
|
||||||||||||||||||||||||||||||||||||||||||||||||||||||||||||||||||||||||||||||||||||||||||||||||||||||||||||||||||||||||||||||||||||||||||||||||||||||||||||||||||||||
| 이 누리집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에서 깁고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배움터(051-516-9268)에 고칠 곳이 있거나 건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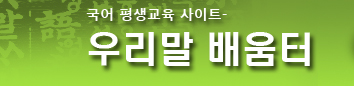 |
|
|
|
||||||||||||||||||||||||||||||||||||||||||||||||||||||||||||||||||||||||||||||||||||||||||||||||||||||||||||||||||||||||||||||||||||||||||||||||||||||||||||||||||||||
| 이 누리집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에서 깁고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배움터(051-516-9268)에 고칠 곳이 있거나 건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