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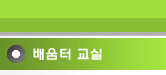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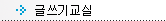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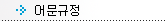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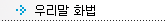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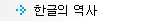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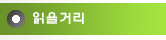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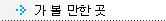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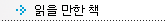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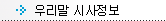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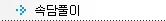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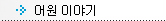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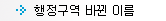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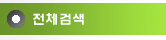 |
|
|
들른 이 182455245 명
깁고 더함 2007/12/2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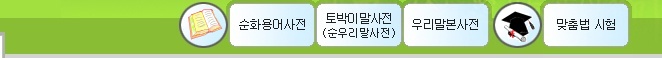 |
| |
|
| |
 |
| |
|
| |
|
 (자녀를 똑똑하게)오염된 국어 순화부터 하자 (자녀를 똑똑하게)오염된 국어 순화부터 하자
|
사람은 말과 더불어 살아간다. 따라서 우리는 소중한 말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우리말의 현실을 돌아보며, 우리말을 갈고 닦아 말과 함께 하는 삶을 한층 더 뜻 깊고 보람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우리말에는 밝고 좋은 점도 많이 있으며, 어둡고 부족한 점도 없지 않다. 우리말이 안고 있는 어두운 현실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의 수많은 낱말들은 들어온 말, 더럽고 거친 말, 규범에 어긋난 말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다. 둘째, 지역과 집단에 따라 말이 달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셋째, 영어 공용화의 시대에 우리말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말이 오염된 채로, 사용하는 지역과 집단에 따라 틈이 벌어지고,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놓인 현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말이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 들어온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은 생각과 느낌을 제대로 주고받을 수 없으므로 힘을 모아 좋은 사회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며, 더럽고 거친 말은 사람과 사회를 욕되고 험악하게 만들어 버린다. 둘째, 우리말이 지역,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이 경우 생각과 느낌을 제대로 주고받지 못하게 되며, 말이 통하는 무리끼리만 가까이 지내고 말이 다른 무리와는 서먹서먹해지게 되어, 우리 겨레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라의 힘을 한 데 모으기 어렵게 된다. 셋째, 우리말과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영어를 우리말처럼 익혀 막힘없이 쓰기란 불가능할 것이며, 영어를 익힌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큰 틈이 벌어질 것이다. 또한, 우리말과 영어가 뒤섞여 사람들의 정신이 어지럽게 될 것이며, 마침내 영어의 힘에 눌려 우리말이 말라죽게 되고 우리의 문화와 얼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을 너무 게을리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말은 오염되고 갈라지고 마침내 사라질지도 모를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는 그 현실을 반성하고, 우리말 사랑의 길을 찾아 나서는 큰 일이 남아 있다. 우리말을 사랑하는 길은 넓고 깊다. 그 가운데서 다음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오염된 우리말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우리말을 다듬는 것을 ‘국어 순화’라고 한다. 이것은 들어온 말, 더럽고 거친 말, 규범에 어긋난 말을 각각 토박이말, 깨끗하고 부드러운 말, 바른 말로 갈고 닦는 것을 뜻한다.
둘째, 우리 삶 가까이 있는 우리말을 어떻게 찾아 익힐 것인가?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모두 제 이름, 곧 낱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낱말을 아는 것은 그 대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첫 걸음이며, 그 길은 우리말 사랑으로 이어진다.
셋째, 우리말의 좋은 점을 어떻게 깨칠 것인가? 우리말에는 좋은 점이 많이 있다. 흙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듯이, 우리말의 좋은 점을 많이 찾아 익히는 것은 슬기로운 일이다. 우리말의 좋은 점 가운데 네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말의 아기자기한 모습이 아름답다. ‘아장아장, 오순도순, 싱글벙글, 곤지곤지’ 등은 모두 모양을 본뜬 말이고, ‘도란도란’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본뜬 말이다. 이처럼 우리말은 모양과 소리를 본뜬 말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우리말의 재미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여우비’는 맑은 날에 잠깐 뿌리는 비를 가리키는데, 햇빛 속에서 여우처럼 빠르게 스쳐 가는 비의 모습이 재미있게 나타나 있다. 이 밖에도 ‘꽃샘추위’, ‘해바라기’, ‘달맞이꽃’ 등도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참 재미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고운 우리말의 모습이 아름답다. ‘하늬바람’은 서풍을 뜻하는 토박이말로서 소리가 곱기 이를 데 없으며, ‘시나브로’는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어 가는 모습을 곱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말이다.
넉넉한 우리말의 모습이 아름답다. ‘한아름’은 두 팔을 벌려 안을 만큼 크고 넉넉한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의 ‘한가위’도 크고 넉넉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말의 어두운 현실과 사랑의 방안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우리말 사랑의 세 가지 길을 실천하는 일이다. 둘째로, 우리말 사랑의 길을 개척하는 일이다. 이제, 우리 모두 ‘국어 사랑 나라 사랑’ ‘나라 사랑 국어 사랑’의 다짐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할 때이다.
임지룡(경북대 국어교육과 교수)
2006/08/16 매일신문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