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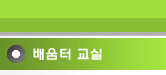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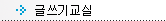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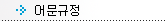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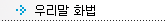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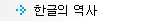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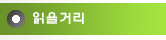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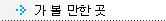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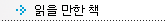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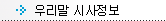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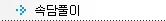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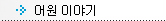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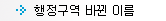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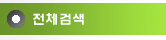 |
|
|
들른 이 179862838 명
깁고 더함 2007/12/2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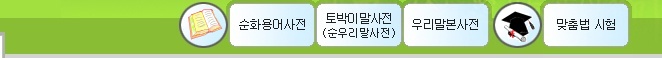 |
| |
|
| |
 |
| |
|
| |
|
 [말글찻집] 토·씨끝 갈피/최인호 [말글찻집] 토·씨끝 갈피/최인호
|
요즘 글들이 말만 많아지고 길어지며 거칠기만 하다고 못마땅해하는 분들이 적잖다. 그런 판단이 어제오늘 나온 것은 아닌데, 그만큼 어른글 아이글 할 것 없이 어지럽다는 얘기겠다. 그런 인상을 주는 실체는 무엇인가?
쉽게 짚이는 게 낱말 쪽이다. 외래·외국어, 전문어 등 낯설고 어려운 말들이 많아진 건 분명하다. 이 쪽은 그동안에도 숱하게 들춰 왔으나 잘 고쳐지지 않은 위에 새로운 말들이 얹혀 문제를 더하는 판세다. 나아가 한 낱말이 다른 말로 단순히 대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때가 많은데, 낱말에는 토씨나 씨끝 곧, 활용어미들이 달라붙어 문장 안에서 성분 자리를 차지하며, 이로써 문장 전체를 비틀기도 한다. 문자(한문)나 서양외래어를 풀이하여 겹쳐 쓰는 문자풀이 말투는 문장이 길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마디(통사) 쪽으로 가면, 각종 상투 표현, 군더더기, 번역문투, 미숙하거나 덜된 문장, 비꼬인 문장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엔 글쓰기 공부와 훈련을 제대로 못했거나 덜 한 까닭이 있을 터이다. 이런 쪽도 어느 정도 들췄고, 그 병폐들도 지적된 바 있다.
저 몇 해 논술 글쓰기가 대학입시 과목이 되더니, 학교에서도 마침내 교과목으로 가르친다. 국어시간에 주로 다룰 일인데, 통합논술에 이르면 분야를 가리지 않으니 학생·교사 두루 큰 품이 들게 되었다. 학교·학원 현장에서나 신문·방송에서조차 논술 글쓰기를 가르친다. ‘입시용’이라는 계기가 마뜩잖고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국민 글쓰기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쪽으로 가다듬었으면 다행이겠다.
궁금한 것은 과연 현장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평가하느냐는 점이다. 무엇보다 배우는 이로서 할 일은 문장을 쓰는 바탕 공부다. 바탕 공부에서 챙겨야 할 것이 말의 갈피를 갖추게 하는 일이며, 역시 글의 됨됨이를 종잡거나 평가하는 데서도 그 ‘갈피’가 큰 잣대가 될 터이다.
갈피 잡기는 문장에서, 특히 토씨와 씨끝을 어떻게 부려 쓰느냐에 달렸다. 생각하는 힘이 그 바탕이다. 그 다음이 독서량 정도라고 할까? 흔히 학자나 교수가 쓴 글들도 어지러운 것은 학생시절 이런 기초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까닭에서 올 때가 많다. 글쓰기에서, 중등학생과 교수의 차이는 관심 분야와 아는 낱말이 많고 적음의 차이(어휘력)가 있을 뿐이다.
숱한 학자들이 살핀바, 우리말을 언어형태로 분류할 때 교착어라고 하는데, 그 성질·특징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는 잣대로 우리글 현실을 짚어볼 수도 있겠다.
교착어(膠着語·부착어·점착어·첨가어)란, 뜻을 지닌 낱말 또는 말줄기에 토씨나 씨끝 따위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가 차례로 달라붙어 월성분을 갖추게 하거나 성분 차이를 나타내는 특징을 지닌 말을 일컫는다. 말차례는 대체로‘임자말-(매김말)-부림말-(어찌말)-풀이말’차례로서, 여기서 토씨나 씨끝이 붙지 않는 성분이 없을 정도다.
실제로 토씨나 씨끝을 부려쓰는 데 따라 말의 뜻·말맛·형식·됨됨이가 달라진다. 흔히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하는 말도 토·씨끝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다. 토씨나 씨끝을 잘 부려쓰지 못하면 말이 너절하게 되거나 불분명해지며, 말이 안 되기도 한다. 이를 잘 부려쓰면 말이 간략해지고 쉬워지며, 뜻이 분명해진다.
최인호/한겨레말글연구소장
2007/01/18 한겨레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