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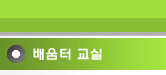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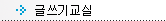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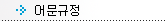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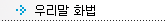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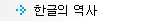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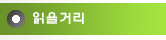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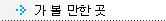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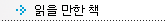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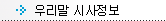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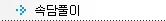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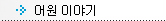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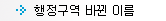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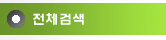 |
|
|
들른 이 179853575 명
깁고 더함 2007/12/2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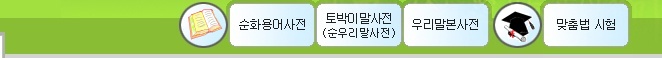 |
| |
|
| |
 |
| |
|
| |
|
 순화대상서 문화의 축으로 `사투리 대반란` 순화대상서 문화의 축으로 `사투리 대반란`
|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1988년 제정된 현 ‘표준어 규정’ 제1항에서는 표준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표준어를 쓰지 않는, 즉 사투리를 입에 담는 사람들은 졸지에 ‘교양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듣고 익힌 생활언어이면서도 ‘표준어 절대주의’에 눌려 ‘교양 없는 변방의 말’로 치부돼온 사투리가 대중문화계를 휩쓸며 대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중문화 속 사투리의 어제와 오늘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 대사를 유행시키며 영화 속 사투리 변천사에 큰 획을 그은 ‘친구’(2001) 이전에도 사투리는 심심치 않게 사용됐다. 그러나 1970, 80년대를 풍미한 박노식의 ‘용팔이’ 시리즈 등처럼 ‘어깨’ 영화를 제외하면, 사투리는 조연들의 몫이었다. 한국영화사를 전공한 조영정씨는 “신성일 같은 대스타, 특히 정의로운 주인공이 사투리를 쓰는 것에 대중들은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시절, 촬영 후 목소리를 따로 입히는 후시녹음’ 시스템은 ‘주인공=표준어’ 공식을 뒷받침하는 도구였다. 대구 출신인 신성일도 스크린 속에서는 성우의 목소리를 빌려 깔끔한 서울말을 구사했다.
사투리에 대한 푸대접은 어문정책의 표준어 절대주의, 지역감정에 대한 정치적 고려 등의 영향이 크지만, 그 결과 은연중에 형성된 ‘사투리는 촌스럽다’는 인식도 적잖이 작용했다. 조희문 상명대 교수는 “그렇잖아도 한국영화를 수준 낮게 보는 마당에 사투리를 쓰면 ‘쌈마이’(삼류영화)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여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방송은 더 강력한 ‘언어 통제’를 받아왔다. 방송심의규정은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특히 고정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제52조)고 명시하고 있다. 옛 심의규정은 이에 더해 사투리를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은어, 비속어 등’과 묶어 ‘순화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영화에서 조폭 코미디, 액션, 멜로 등 장르를 불문하고 사투리가 애용되고, 이경규 강호동 김제동 등이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무기 삼아 오락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요즘에 비춰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방송위원회가 2004년 10월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면서 ‘사투리나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국어순화의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제53조)는 규정에서 사투리를 삭제한 것도 이런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사투리 전성시대의 명과 암
장르를 불문한 사투리의 홍수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좇는 대중문화의 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조영정씨는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가 주로 쓰인 조폭영화가 시들해지자 강원도로 눈길을 돌리는 식으로, 지나간 것에 대한 식상함과 새로움의 추구가 맞물려 사투리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영화나 드라마 모두 특정 지역을 무대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는 사례가 늘면서 사투리는 리얼리티를 부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주요소가 됐다.
사투리의 재발견은 사투리에 덧씌워진 왜곡된 이미지를 벗겨내고 우리말을 살찌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MBC ‘말(言) 달리자’의 이현주 작가는 “우리말이 외국어에 비해 표현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왔는데 사투리는 표준어의 그것을 뛰어넘는다”면서 “섬세한 감정까지 담긴 토속어에는 특히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외래어를 대체할 만한 좋은 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업화 한 사투리 열풍은 정확한 고증과 연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지역불명 ‘짝퉁 사투리’의 범람을 낳기도 한다. 최병두 시인(강화여중 교장)은 “방송이나 영화 속 사투리가 실제 그 지역에서 쓰는 말과 다른 경우가 많아 되레 지역 말을 왜곡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사투리 자체를 희화화 하거나 특정 지역에 관한 고정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다. 전라도 사투리가 여전히 조폭의 언어로 애용되고, ‘경상도 사투리=무뚝뚝함, 강원도 사투리=순박함’이라는 공식이 통용된다. 조희문 교수는 “내용보다는 캐릭터, 특히 말장난으로 승부하려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면서 “사투리의 재발견이 문화적 다양화라는 점에서는 좋지만 작품성에서는 오히려 빈약해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006/05/19 한국일보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