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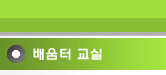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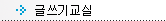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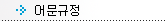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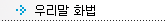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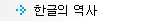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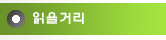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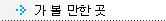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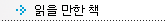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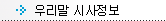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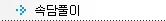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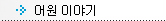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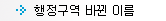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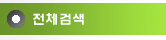 |
|
|
들른 이 179861471 명
깁고 더함 2007/12/2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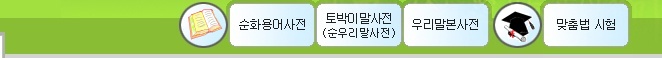 |
| |
|
| |
 |
| |
|
| |
|
 `생갈비` 대신 `맨갈비` 표기가 바람직 `생갈비` 대신 `맨갈비` 표기가 바람직
|
음식점에도 우리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본다. 차림표에 ‘김치찌게, 생태찌게, 된장찌게’로 표기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찌게’는 ‘찌개’가 바른 표기이다.
'찌개'는 뚝배기나 작은 냄비에 국물을 바특하게 잡아 고기ㆍ채소ㆍ두부 따위를 넣고, 간장ㆍ된장ㆍ고추장ㆍ젓국 따위를 쳐서 갖은 양념을 하여 끓인 반찬이다.(찌개를 끓이다/찌개를 데우다/찌개에 밥을 비벼 먹다/찌개 국물이 적다.)
‘찌게’는 ‘찌개’가 바른 표기이다. 이러한 표기 혼란의 뿌리는 발음부터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국어 교육은 발음 교육 등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
이러한 표기 혼란의 뿌리는 발음부터 시작된 것이다.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ㅔ’와 ‘ㅐ’는 발음을 구별하게 되어 있다. ‘ㅔ’는 입을 적게 벌리고 혀를 낮추지 않는다. 이에 비해 ‘ㅐ’는 ‘ㅔ’보다 입을 많이 벌리고 혀를 더 낮추어 발음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둘의 발음을 구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이런 발음상의 어려움이 표기법의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혼란은 ① 그이가 말을 아주 잘 하데./그 친구는 아들만 둘이데.//왜 이렇게 일이 많대?/신랑이 어쩜 이렇게 잘생겼대?(앞의 ‘-데’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이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뒤의 예는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대’가 쓰인 것이다.)
② 보고도 못 본 체 딴전을 부리다./모르는 체를 하며 고개를 돌리다.//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간다./노루를 산 채로 잡았다.(앞은 그럴 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뒤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③ 머리를 꼿꼿이 세우다./몸을 바짝 세우다.//밤을 새워 공부하다./책을 읽느라고 밤을 새우다.(앞은 ‘서다’의 사동사로 서게 하다의 뜻이다. 뒤는 주로 ‘밤’을 목적어로 하여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상 언어생활을 하면서‘네가/내가, 메기다/매기다, 베다/배다, 헤치다/해치다’ 등은 발음 구분도 안 되고, 표기할 때도 어느 것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우리는 한글 창제 이후 순우리말이나 한자음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는 우리말이 발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1934년 표준말 사정(査定) 때 긴소리·된소리 등 표준 발음을 사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근대 국어교육을 하면서 읽기·쓰기 중심의 교육으로 말하기·듣기의 교육이 소홀해지면서 발음 교육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현재 표준어 규정에 ‘표준 발음법’을 두고 있지만, 받침소리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등 극히 일부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고등학교 국어(국민 공통 기본 과목 10학년) 교과서에도 ‘바른 말 좋은 글’이라는 단원이 있어 ‘말다듬기, 문장다듬기, 글다듬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발음에 대한 교육과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도 심도 있는 발음 교육, 특히 과학적인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
음식점 차림표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생갈비’라는 표현이다. ‘생갈비’는 ‘양념갈비’의 상대적 표현으로 쓴다. 즉 ‘양념갈비’는 참기름, 마늘, 파, 깨 등 갖은 양념으로 숙성을 시켜 구워 먹는 것이니, ‘생갈비’는 양념을 하지 않고 바로 숯불에 구워 먹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념을 하지 않은 고기’는 ‘맨’이라는 접두사를 붙여, ‘맨갈비’라고 해야 자연스럽다. 우리는 생갈비인 ‘맨갈비’와 ‘양념갈비’를 익혀 먹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고깃집에는 ‘생삼겹살, 생등심, 생목살’이라는 차림표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는 앞의 ‘생갈비’와 다른 쓰임으로 이해된다. 이는 원래 ‘삼겹살, 등심, 목살’이라고 해야 할 단어 앞에 ‘생-’이라는 접두사를 넣은 것이다.
원래 접두사 ‘생-’은 ‘음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익지 아니한’의 뜻을 더한다. 사전에는 이러한 용례로 ‘생김치/생나물/생쌀’이 올라 있다. 하지만 ‘생삼겹살, 생등심, 생목살’은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이다. 이는 음식점에서 억지로 만들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생-’을 붙이면 ‘싱싱하고 좋은 의미’가 더해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 걸러야 할 말의 찌꺼기이다
2006/06/01 국정브리핑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