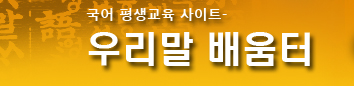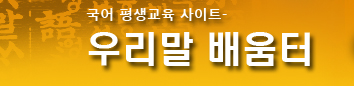소재(素材)와 표현
조지훈(趙芝薰)
사람은 누구나 제각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까닭에 글을 쓰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저마다의 마음속에 나타내고 싶은 일, 즉 남에게 호소(呼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글을 쓴다.
사람을 가리켜 사색(思索)하는 동물이라 한다. 사색하는 기능(機能), 이것이 바로 이성(理性)의 바탕이 되는데,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의 싹을 가지고 있 다. 공부는 왜 하는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이 모두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수많은 감정을 느낀다. 기쁘고, 슬프고, 노여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모두 다 느낌의 움직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감성(感性)의 동물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느낄 줄 안다는 것은 사람이 본디부터 갖추고 있는 능력이지만, 생각과 느낌은 바깥의
사물(事物)에 부딪히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해와 달, 산과 내, 짐승과 나무,
이러한 자연계(自然界)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풍성하게 한다. 집과 마을, 학교와 직장, 나라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생활이 또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살지게 한다. 다른 사람이 남겨 놓은 문학 작품과 그림과
노래와 춤 등, 이러한 예술이 또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격동시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과 사회와 예술의
전부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의 소재가 된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보고, 듣고, 이용하고, 만들고, 허물어 버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의 재료(材料)가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글의 소재도 생각과 느낌이요, 글로 표현하는 것도 생각과 느낌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글을 쓸 때에 생각은 안에 있고, 소재는 밖에 있으며, 표현의 말의 구성에 있고, 전달은 글자의
기록에 매인다고 생각해야 한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글의 소재, 곧 재료가 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소재일뿐, 그것 그대로를
글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마치, 흙으로 옹기를 굽는다고 하여 흙을 가리켜 옹기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한 소재들이 글이 되려면 글의 표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생각과 느낌의 표현 수단으로 인간이 말과 글자를
가지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말을 글자로 써 놓았다고 하여 모두가 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법에 맞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 글을 쓰는 데는 솜씨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표현이라는 것은 단순(單純)히 생각이나 느낌을 아무렇게나 나타내는 것을 말함이 아니요,
그 생각과 느낌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한 온갖 노력의 합성(合成)을 뜻하는 것이다. 글을 잘 짓는다는 것은
표현하는 힘에 달린 것인데, 표현하는 힘은 소재를 파악하고 조리(條理) 있게 구성하는 솜씨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훌륭한 표현을 위해서는, 먼저 그 막연한 소재들을 명확하게 붙잡는 개성적(個性的)인 눈을 마련해야 한다. 개미를
그리려면 매미의 생태(生態)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달을 표현하려면 동전 같다든지 빵과 같다든지 하는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 글쓰는 사람의 지식(知識)과 사상(思想)과 취미와 성격 등은 글 속에 은연중에 나타나게 된다.
훌륭한 표현을 위해서는, 소재를 조리 있게 구성하는 효과적(效果的)인 솜씨를 익히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이
힘이 붙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그것을 표현할 도리가 없다. 생각을 풀어 내는 차례가 뒤범벅이 되면,
문맥이 닿지 않고 뜻이 흐려지는 글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나타내고 싶은 생각을 어떻게 앞뒤에 배치하고 어디를
끊었다가 어디에 잇는지에 따라, 그 글의 맛이 아주 달라진다. 그 내용에 부합하는 표현은 그 구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개성적인 눈은 바탕이요, 효과적인 솜씨는 설계(設計)인데, 그 바탕 위에 그 설계를 따라서 이루어진 건축(建築)이
곧 글이다. 그렇게 때문에, 글에는 개성적인 눈도 나타 나고, 효과적인 솜씨도 나타나며, 인품의 향기(香氣)도
풍겨 나온다.
다시 말하면, 글이란 쓰는 사람의 안에 있을 때에는 생각이 바탕이지만, 바깥에 나타날 때에는 문장(文章)이
근본(根本)이 된다. 그러므로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이 글쓰는 첫 힘이 되듯이, 문장을 깔끔하게 다듬는 것이 또한
글쓰는 마지막 힘이 된다.
사물을 관찰하는 데 치밀(緻密)하고 날카로우며, 평범한 사실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줄 알라. 아무나
보고 느낄 수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붙잡아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말이면서도 제자리에다 놓을 줄
모르는 말, 자기 자신의 눈으로 다시 발견한 말들을 잡아라. 글을 위해서는 눈은 과학자(科學者)를 닮고, 솜씨는
정치가를 배우고, 문장은 화가의 수법(手法)을 배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천진(天眞)한 눈, 억지로 꿰맨 자국이 없는 그 솜씨, 순수하면서도 거침없는 문장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고려 때 이름난 시인 정지상(鄭知常)은, 어릴 때에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를 보고, "그 누가 새붓을
잡아 강물 위에 저렇게 '새 을(乙)' 자를 썼노?"라고 읊었다고 한다. 프랑스의 문인 르나르는 어른이
되어 개미를 보고 지은 글에서, "한 마리 한 마리가 '3'이라는 숫자와 같다."라고
하였다. 대수롭지 않은 생각이지만, 그 눈의 느낌 이 얼마나 참신하고 개성적인가.
석류(石榴) 껍질 속에
새빨간 구슬이 부서졌구나!
이는 이이(李珥)가 어릴 때 석류를 보고 지은 시다.
투명한 석류알은 가을을 장식하는 홍보석이어니.
이것은 우리나라 어느 현대 시인의 시다. 아이와 어른이 다르고 예와 이제가 또 다르 건만, 그 보는 눈,
그 느낌이 어쩌면 이렇게도 들어맞는단 말인가?
소재를 잡는 눈과 느낌이 부족한 사람이란, 봄이란 제목으로 글을 쓸 경우, 강남(江南) 제비 오고 노랑나비
날고, 아지랑이 아른거리고, 버들개지 물오르고, 빨강 치마 입고 나물 캐는 색시 따위를 늘어놓는 글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따위의 소재만을 늘어놓는 글을 읽을 마음이 내키지 않는 법이다. 글쓰는
사람의 개성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흔한 소재를 글로써 다루려면, 관찰하고 파악하는 각도를
강렬(强烈)한 개성으로써 잡아야 한다. 그러나 개성적인 솜씨로 소재를 다룬다 하더라도,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할
때에는 온건하고 진실해야 한다.
-중학 2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
|